코로나19로 펀드레이징 미뤄지며 일정 차질도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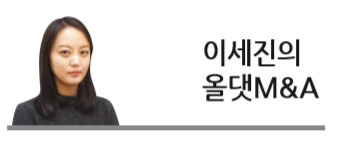
[헤럴드경제=이세진 기자] 국내 M&A 시장이 이제는 성장을 넘어 성숙 단계에 들어섰다. 지난해 말 기준 투자자들이 PEF에 출자하기로 약속한 약정액은 84조3000억원에 이르렀고, 처음 국내 자본시장에 도입된 2004년 당시 단 2개에 불과했던 PEF는 716개로 크게 늘어났다.
PEF를 키 플레이어로 하는 M&A 시장이 진용을 갖추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. 1조원 이상의 블라인드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대형 PEF들과 수십~수백억 규모의 펀드 조성에도 진땀을 빼는 소형 PEF 간의 양극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.
PEF의 경쟁력은 성공적인 투자에도 있지만, 펀드레이징부터가 진짜 경쟁력의 시작이다. PEF 수가 많아지면서 펀드레이징, 즉 출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. 대형 PEF들에 비해 투자 트랙레코드가 빈약한 중소형 PEF는 기업이나 개인투자자 등 출자자에게 자신들의 경쟁력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.
국내 PEF 시장의 ‘큰 손’들인 연기금 등 출자기관들의 관심을 끌기는 더욱 어렵다. 기관투자자(LP)가 출자사업의 위탁운용자(GP)가 되는 PEF를 선정할 때는 과거 투자 수익률 등 성과와 전문운용인력의 수 등 정량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 쉽게 말해 국내 ‘3대 PEF’로 손꼽히는 MBK파트너스, 한앤컴퍼니, IMM PE는 ‘이름값’과 긴 업력,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출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쉽다.
한 출자기관의 투자 담당 임원은 “연금이나 공제회 등 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들의 특성상, GP를 선정할 때 트랙레코드를 가장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”면서 “PEF 대표 등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경쟁 프리젠테이션(PT)을 통해 출자기관의 구미에 딱 맞는 투자 계획이나 경쟁력을 보여주려고 해도 막판에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”고 말했다.
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은 출자액 규모에 따라 미드캡(Mid-Cap), 그로쓰캡(Growth-Cap), 벤처, 루키 등 리그를 다양화해 경쟁 자체에도 칸막이를 두고 있다. 하지만 이마저도 신생 혹은 소형PEF의 출자까지 이어지기에는 경쟁이 치열하다.
코로나19 사태도 최근 펀드레이징에 제동을 걸고 있다. 사학연금과 노란우산공제회 등은 출자 평가와 결과 발표 등 일정을 조금씩 미뤄 잡았다. 펀드 조성을 마치고 투자를 진행해 관리보수 등 수익을 내야 하는 PEF들은 일정 지연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.
‘4수’ 끝에 최근 한 기관투자자 출자에 성공해 블라인드펀드를 조성 중인 PEF 임원은 “첫 펀드를 조성할 때는 기관들의 출자를 받을 수 없어 정말 발로 뛰며 20억~30억원씩 모았다”면서 “(기관 출자를 받아) 올해 출발이 좋았지만 코로나 사태로 펀드 조성이 미뤄지고 있어 걱정”이라고 말했다.
jinlee@heraldcorp.com








